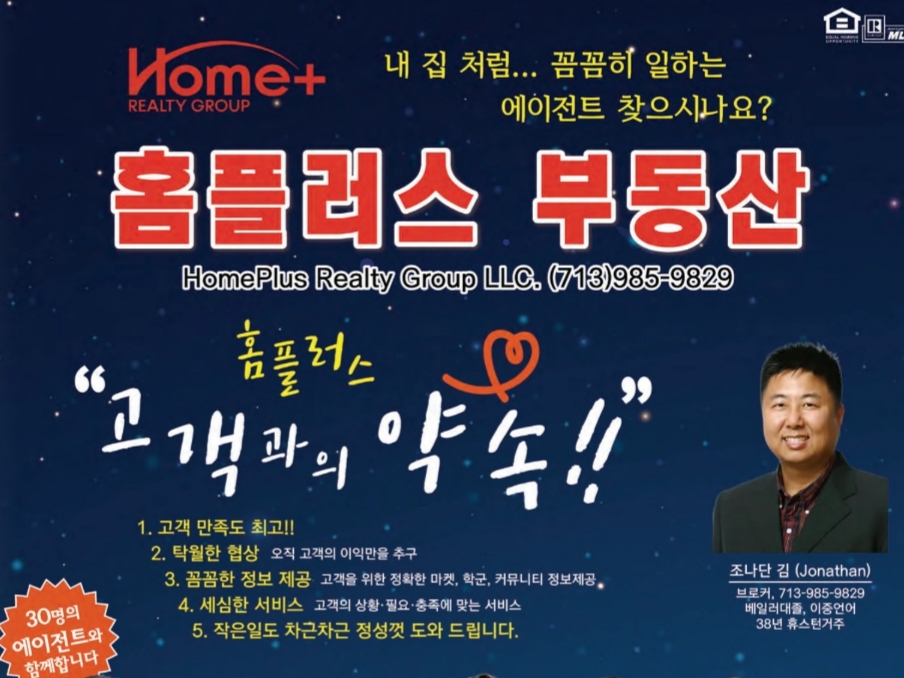- 뇌는 왜 깊은 잠을 원하나…새 연구가 밝힌 수면의 힘
- ‘몇 시간’보다 ‘어떻게’ 자느냐가 뇌 건강 좌우한다
- 밤마다 뇌 청소…깊은 수면이 치매 예방 열

뇌 건강, ‘8시간 수면’보다 중요한 것 드러났다
― 수면의 ‘질과 패턴’이 뇌 기능 좌우…전문가들 “생활 리듬 관리가 핵심”
“하루 8시간은 꼭 자야 한다”는 오래된 건강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단순한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규칙성임을 보여준다. 뇌 과학의 시선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리듬과 패턴에 맞춰지고 있다.
수면 시간의 함정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40~70대 성인 1,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다. 매일 8시간 가까이 잤던 집단이라도 깊은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어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았다. 반면 수면 시간이 다소 짧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깊은 수면을 유지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았다.
연구진은 “뇌 건강에는 깊은 수면 단계(비REM 수면)의 비율이 중요하다”며 “수면 시간 자체는 단순 지표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뇌는 잠들 때 청소한다
뇌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개념은 ‘글림프틱 시스템(glymphatic system)’이다. 수면 중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일종의 배수관 기능이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이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며, 아밀로이드-β 같은 단백질을 제거한다. 이 물질이 쌓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촉발할 수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서 역시 “수면 시간이 아닌 수면의 질이 알츠하이머 발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에는 깨어 있을 때도 일부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 “깊은 수면에서만 활성화된다”는 단정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낮 생활이 밤 수면을 만든다
수면의 질은 밤에만 결정되지 않는다. 낮 동안의 활동량, 햇빛 노출, 카페인 섭취, 스마트폰 사용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한국수면학회는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햇빛을 쬐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특히 교대근무자의 경우 불규칙한 생활 패턴 때문에 치매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다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 메타 분석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30~40% 증가했고, 영국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30%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배 높다”는 식의 과장은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수면과 사회적 비용
수면 문제는 개인 건강을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유럽의 산업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수면은 업무 생산성을 낮추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공통된 결과가 나온다. 다만 ‘18% 감소’ 같은 구체적 수치에는 연구마다 차이가 크며, 단일 수치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생활 속 ‘잘 자는 법’
전문가들이 권하는 뇌 건강 수면 습관은 비교적 단순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기상하기
취침 전 스마트폰·TV 사용 자제
낮 동안 충분한 활동과 햇빛 노출
카페인과 알코올 절제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뇌 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이번 연구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얼마나 오래 자는가”보다 “어떻게 자는가”가 중요하다. 과거의 8시간 수면 신화는 평균적 권장치일 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보건 정책과 직장 복지 제도도 ‘수면 시간 확대’보다는 수면 환경 개선과 생활 패턴의 규칙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뇌 건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며, 정책적 투자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뇌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 깊고 규칙적인 수면이야말로 뇌를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핵심 조건이다. 이제 뇌 건강을 위한 새로운 상식은 “8시간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리듬”이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뇌 건강, ‘8시간 수면’보다 중요한 '이것' 드러났다
오랫동안 “하루 8시간 수면”이 건강의 기준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과 규칙성이 뇌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틱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며, 이는 치매와 직결된다. 교대근무자처럼 불규칙한 생활은 치매·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 단순한 수면 시간이 아니라 깊고 규칙적인 잠이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
뇌 건강, ‘8시간 수면’보다 중요한 '이것' 드러났다
오랫동안 “하루 8시간 수면”이 건강의 기준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과 규칙성이 뇌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틱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며, 이는 치매와 직결된다. 교대근무자처럼 불규칙한 생활은 치매·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 단순한 수면 시간이 아니라 깊고 규칙적인 잠이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
 “생산적 협상 계속 중”… 한·미 무역협상, ‘불공정 장벽’ 해소에 진전 보일까
2025년 7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국이 설정한 8월 1일 시한 전까지 이른바 ‘불공정 무역장벽’에 대한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는 단순 관세 문제를 넘어 향후 한미 경제 동맹의 기조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생산적 협상 계속 중”… 한·미 무역협상, ‘불공정 장벽’ 해소에 진전 보일까
2025년 7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국이 설정한 8월 1일 시한 전까지 이른바 ‘불공정 무역장벽’에 대한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는 단순 관세 문제를 넘어 향후 한미 경제 동맹의 기조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날까? … 러시아 드론, 폴란드 영공 침범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날까? … 러시아 드론, 폴란드 영공 침범
 오라클, 하루 만에 36% 폭등… 무슨 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라클, 하루 만에 36% 폭등… 무슨 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박진영은 공직, 방시혁은 수사…K-POP 두 거장의 엇갈린 운명
박진영은 공직, 방시혁은 수사…K-POP 두 거장의 엇갈린 운명
 빠델, 부유층의 새로운 사교문화로 부상
빠델, 부유층의 새로운 사교문화로 부상
 개인정보위, KT·LGU+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 KT·LGU+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미국 유학생들이 얘기하던 바로 그 브랜드…치폴레, 드디어 한국 상륙!!
미국 유학생들이 얘기하던 바로 그 브랜드…치폴레, 드디어 한국 상륙!!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