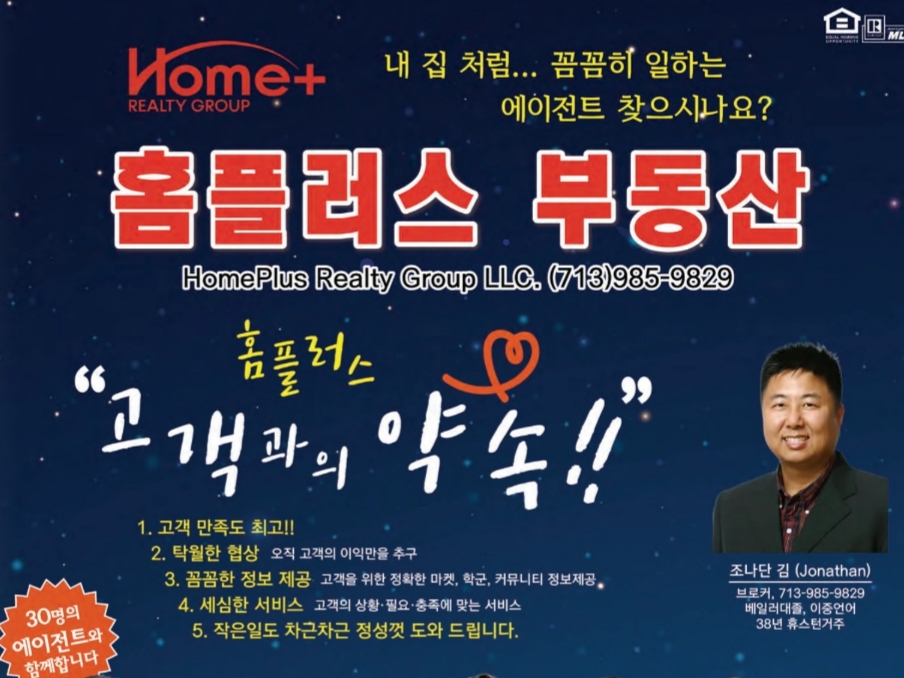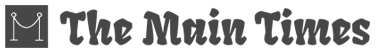- IRP, 세제 혜택 + ETF 수익으로 이중 효과
- IRP 적립금 107조…국민 노후 지갑이 바뀐다
- 상위 10% IRP 가입자, ETF로 두 배 벌었다
“주식보단 안전하고 채권보단 많이 벌고”…IRP 투자 전환 시점
직장인 김 과장은 최근 아파트를 처분한 뒤 IRP 계좌로 자금을 이동했다. 그는 IRP 내 규정상 '안전자산'이지만 채권·주식 혼합 ETF를 활용해 위험자산 비중을 국내외 위험투자 기준 한도(70%)를 넘긴 85% 수준으로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IRP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 흐름의 한 단면이다.

■ IRP, 연 100조 원의 성장 축으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은 107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5% 증가했다. 이러한 급성장은 IRP가 퇴직연금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한다.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에서도 최근 5년간 제도 개편을 통해 IRP가 시장 확대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 ‘IRP 부자’ 김 과장의 금융 대전환
김 과장은 자신을 ‘공격 투자형’이라 칭하며, IRP 계좌의 안전자산 규정을 '역이용'했다. 그는 S&P500 ETF 등 위험자산 비중을 IRP 내 허용 한계 70%까지 채우고, 남은 안전자산 몫에는 미국 배당주와 미국 국채가 혼합된 ETF(SOL 미국배당미국채혼합50)를 담아 위험자산 비중을 사실상 85%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 ETF 활용한 퇴직연금 전략이 대세
IRP 내에서는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높은 가입자들이 두 배 수준의 수익률(9% 수준)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4년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평균 수익률은 4.77%였던 반면, 상위 10% 가입자들은 ETF 중심의 운용으로 9% 수준의 수익을 실현했다.
또한, 증권권에서의 IRP 가입자 가운데 상위 10%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90% 이상 포함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도 있다.
■ 퇴직연금은 ‘저축’에서 ‘투자’로
금융 전문가들은 과거 퇴직연금이 예·적금 중심의 안전 자산 중심이었으나, 물가 상승과 기대수명의 장기화로 인해 실질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 중심의 구조로 변화 중이라고 진단한다.
■ 향후 트렌드와 제도 과제
IRP 투자 전략의 변화는 ETF 상품 다양화와 연관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SOL, ACE, KODEX 등 주식·채권 혼합형 ETF가 IRP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며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IRP 가입자는 자산 분산 전략 수립, 정기 점검, 전문가 조언 활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IRP는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도 병행됨으로써 노후 자산 운용의 핵심 도구로 부상했다.
김 과장의 사례는 IRP라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단순한 저축을 넘어 능동적 투자로 확장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IRP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개인별 자금 활용 전략도 진화 중이며, ETF 활용은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다만, 안전자산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상품 선택이 필연적이다.
 ‘실수 반복’ 비판…GPT-5는 정말 덜 똑똑한가?
오픈AI의 최신 모델 GPT-5가 출시 직후 철자·지명 오류 등 단순 실수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를 ‘Calforhia’로 표기한 사례가 보도됐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속도 저하·오류 반복에 불만을 드러냈다. 오픈AI는 “모델 라우팅 기능 초기 장애” 때문이라며 GPT-4o 선택권을 다시 제공했다. GPT-5는 사실 오류(환각) 감소 등 긍정 평가도 있으나, 안전장치 강화로 인한 과도한 거부와 기능 축소가 불만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수 반복’ 비판…GPT-5는 정말 덜 똑똑한가?
오픈AI의 최신 모델 GPT-5가 출시 직후 철자·지명 오류 등 단순 실수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를 ‘Calforhia’로 표기한 사례가 보도됐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속도 저하·오류 반복에 불만을 드러냈다. 오픈AI는 “모델 라우팅 기능 초기 장애” 때문이라며 GPT-4o 선택권을 다시 제공했다. GPT-5는 사실 오류(환각) 감소 등 긍정 평가도 있으나, 안전장치 강화로 인한 과도한 거부와 기능 축소가 불만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IRP의 새로운 트렌드, 이렇게 해야 돈 번다
퇴직연금의 대표 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빠르게 성장하며 ‘투자형 자산운용’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적립금은 2025년 1분기 기준 107조 원을 넘겼고, 실적배당형 상품을 적극 활용한 상위 가입자들의 수익률은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IRP 부자’ 김 과장 사례처럼 혼합 ETF를 안전자산에 편입해 사실상 위험자산을 80% 이상 보유하는 전략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과거 저축 위주였던 퇴직연금이 ETF 중심의 투자 자산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IRP의 새로운 트렌드, 이렇게 해야 돈 번다
퇴직연금의 대표 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빠르게 성장하며 ‘투자형 자산운용’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적립금은 2025년 1분기 기준 107조 원을 넘겼고, 실적배당형 상품을 적극 활용한 상위 가입자들의 수익률은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IRP 부자’ 김 과장 사례처럼 혼합 ETF를 안전자산에 편입해 사실상 위험자산을 80% 이상 보유하는 전략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과거 저축 위주였던 퇴직연금이 ETF 중심의 투자 자산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생산적 협상 계속 중”… 한·미 무역협상, ‘불공정 장벽’ 해소에 진전 보일까
2025년 7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국이 설정한 8월 1일 시한 전까지 이른바 ‘불공정 무역장벽’에 대한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는 단순 관세 문제를 넘어 향후 한미 경제 동맹의 기조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생산적 협상 계속 중”… 한·미 무역협상, ‘불공정 장벽’ 해소에 진전 보일까
2025년 7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국이 설정한 8월 1일 시한 전까지 이른바 ‘불공정 무역장벽’에 대한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는 단순 관세 문제를 넘어 향후 한미 경제 동맹의 기조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K-뷰티, 세계를 흔들다…AI 시대의 ‘디지털 보부상’
K-뷰티, 세계를 흔들다…AI 시대의 ‘디지털 보부상’
 이번 폭우 도대체 왜 생긴건가? - 가양대교까지 잠겼다
이번 폭우 도대체 왜 생긴건가? - 가양대교까지 잠겼다
 일본 2위 부자, 단 2주 만에 재산 12조원 증가한 이유는?
일본 2위 부자, 단 2주 만에 재산 12조원 증가한 이유는?
 배달 죽집, 2000원 레토르트 죽을 1만3500원에 판매…논란 확산
배달 죽집, 2000원 레토르트 죽을 1만3500원에 판매…논란 확산
 “사람이 좋아서 모였다” … 배우 문소리•웨스턴 에비뉴 감독도 찾은 헤이든 원 사진 전시회
“사람이 좋아서 모였다” … 배우 문소리•웨스턴 에비뉴 감독도 찾은 헤이든 원 사진 전시회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