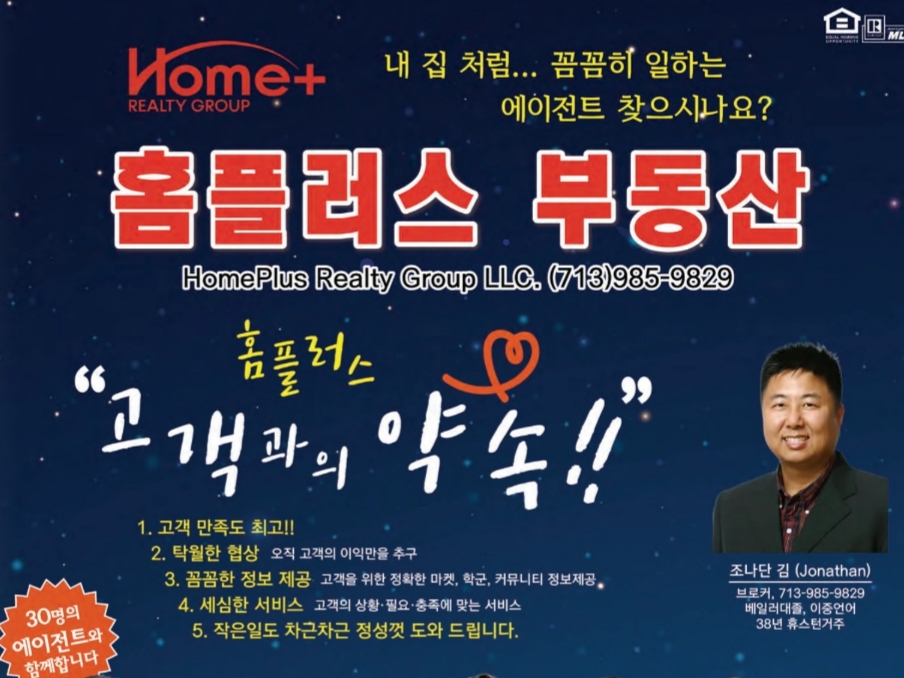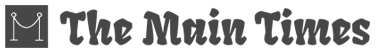- “왜 태풍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릴까?”
- “태풍 이름 속 아시아 문화 지도…별자리·동물·꽃까지”
- “공포의 이름 ‘하이옌’…태풍 이름은 언제 퇴출되나”
태풍 이름, 누가 어떻게 짓나…문화와 국제 협력의 숨은 세계

여름철마다 뉴스에 등장하는 태풍 이름들을 보면 낯설고도 이색적이다. ‘사우델로르’, ‘차바’, ‘콩레이’, ‘흰남노’….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섞여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태풍 이름에는 국제 협력과 각국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시아 14개국이 만든 ‘공동 리스트’
태풍 이름은 세계기상기구(WMO) 산하 태풍위원회가 정한다. 이 위원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미국, 필리핀 등 14개 나라가 참여한다. 각국은 10개씩 총 140개의 이름을 제출해 놓고,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순서대로 붙인다. 때문에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에는 영어, 한자, 한국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다양한 언어가 뒤섞인다.
왜 이름을 붙일까?
과거에는 단순히 “제○호 태풍” 식으로 불렀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태풍이 발생할 경우 혼동이 커지고, 대중에게 경각심을 주기 어려웠다. 2000년부터는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 재난 대응 효율을 높이고, 피해 예방 효과를 노리게 됐다. 예컨대 “2003년 제14호 태풍”보다 “태풍 매미”라고 하면 훨씬 명확하다.
한국이 낸 이름들
한국은 문화적 색채가 담긴 이름을 제출해 왔다. ‘가이(강하다)’, ‘나리(백합)’, ‘장미’, ‘무지개’, ‘흰남노(흰 나무)’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07년의 ‘나리’는 제주에 큰 피해를 남겨 이름이 퇴출됐다. 2022년의 ‘흰남노’는 포항·부산을 덮치며 심각한 침수 피해를 남겼다. 이후 ‘흰남노’라는 이름은 다시 쓰이지 않게 됐고, 한국은 새로운 이름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중국·필리핀은 어떤 이름을 내나
일본은 별자리와 자연 현상에서 이름을 많이 가져온다. ‘야기(염소자리)’, ‘텐빈(천칭자리)’, ‘하기비스(빠르다, 필리핀어)’ 같은 이름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동물 이름을 선호한다. ‘사자’, ‘용왕(룽왕)’, ‘바비(호랑이)’ 등은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필리핀은 인명(사람 이름)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호세’, ‘로사’, ‘다나스(경험하다)’처럼 친근한 느낌의 이름들이 등장한다. 이렇듯 태풍 이름만 보아도 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취향과 언어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이름이 퇴출되는 경우
태풍이 유난히 큰 피해를 남기면, 그 이름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2003년 태풍 ‘매미’다. 131명이 숨지고 4조 원이 넘는 피해를 남긴 뒤, ‘매미’라는 이름은 영구 퇴출됐다. 한국이 제출한 ‘나리’ 역시 같은 이유로 사라졌다. 이는 피해자의 아픔을 존중하고, 같은 이름으로 다시 공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다.
다시 돌아오는 이름들
퇴출되지 않은 이름은 일정 주기가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총 140개 이름이 돌고 도는 구조라, 약 5~6년 뒤 같은 이름을 또 만나게 된다. 예컨대 2018년에 쓰였던 ‘콩레이(중국어로 장미)’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름,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름에 담긴 국제 협력
태풍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재난 앞에서 국제 사회가 협력한다는 상징이다. 태풍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 체계는 곧 공동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태풍 이름에 겨진 의미
우리가 무심코 듣는 태풍 이름 하나에도 사실은 국제 협력의 역사와 각국 문화의 흔적이 담겨 있다. “흰남노”처럼 한국어가 세계 방송에서 그대로 불리고, “하이옌”처럼 특정 지역의 아픔이 기억되는 이름도 있다. 태풍은 매년 되풀이되지만, 그 이름들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인간 사회의 협력과 기억의 무게가 함께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동결… 이번 동결이 말하는 것은?
8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올해 들어 네 차례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선 뒤 두 달 연속 동결을 이어간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미국과의 금리 차가 주요 배경이다. 반도체 수출은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는 부진한 가운데, 물가·환율 불안 요인도 잠재돼 있다. 이번 동결은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메시지로, 향후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 사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동결… 이번 동결이 말하는 것은?
8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올해 들어 네 차례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선 뒤 두 달 연속 동결을 이어간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미국과의 금리 차가 주요 배경이다. 반도체 수출은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는 부진한 가운데, 물가·환율 불안 요인도 잠재돼 있다. 이번 동결은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메시지로, 향후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 사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
 태풍 이름, 누가 어떻게 짓나…14개국의 숨은 협력
태풍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국제 협력과 문화가 담긴 결과물이다. 세계기상기구(WMO) 산하 태풍위원회에 속한 14개국이 각각 10개의 이름을 제출해 총 140개를 순환 사용한다. 한국은 ‘나리(백합)’, ‘흰남노(흰 나무)’ 등 자국 문화가 반영된 이름을 내놓았으며, 일본은 별자리, 중국은 동물, 필리핀은 사람 이름을 주로 사용한다. 피해가 극심했던 ‘매미(2003년)’, ‘하이옌(2013년)’, ‘흰남노(2022년)’ 같은 이름은 영구 퇴출된다. 태풍 이름에는 단순한 구분 이상의 기억과 협력의 의미가 담겨 있다.
태풍 이름, 누가 어떻게 짓나…14개국의 숨은 협력
태풍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국제 협력과 문화가 담긴 결과물이다. 세계기상기구(WMO) 산하 태풍위원회에 속한 14개국이 각각 10개의 이름을 제출해 총 140개를 순환 사용한다. 한국은 ‘나리(백합)’, ‘흰남노(흰 나무)’ 등 자국 문화가 반영된 이름을 내놓았으며, 일본은 별자리, 중국은 동물, 필리핀은 사람 이름을 주로 사용한다. 피해가 극심했던 ‘매미(2003년)’, ‘하이옌(2013년)’, ‘흰남노(2022년)’ 같은 이름은 영구 퇴출된다. 태풍 이름에는 단순한 구분 이상의 기억과 협력의 의미가 담겨 있다.
 KB국민은행, 2025 하반기 신입·경력 공개채용 개시…사회적 책임 반영한 KB 채용
KB국민은행은 2025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신입 150명, 경력 30명 등 총 180여 명을 선발한다. 신입은 △UB(유니버설뱅커) △ICT △공인회계사 △보훈 △특성화고 △전역장교 등 6개 부문이며, 경력직은 변호사·AI 전문가 등을 수시 채용한다.
전형 방식은 부문별로 상이하다. UB는 ‘서류-필기-면접’, ICT는 ‘코딩테스트-면접’ 전형을 적용하며, 공인회계사는 면접 중심으로 선발한다. 보훈·특성화고·전역장교 등은 사회적 책임 채용으로 별도 절차가 마련된다.
서류 접수는 9월 9일(화) 18시 마감, 최종 합격자는 11월 중 발표된다. 이번 채용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문직 신설·수시채용 확대, ▲사회적 포용 인재 선발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국민은행은 “금융·디지털·전문성을 아우르는 미래형 인재” 확보를 강조하며 다양한 지원을 당부했다.
KB국민은행, 2025 하반기 신입·경력 공개채용 개시…사회적 책임 반영한 KB 채용
KB국민은행은 2025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신입 150명, 경력 30명 등 총 180여 명을 선발한다. 신입은 △UB(유니버설뱅커) △ICT △공인회계사 △보훈 △특성화고 △전역장교 등 6개 부문이며, 경력직은 변호사·AI 전문가 등을 수시 채용한다.
전형 방식은 부문별로 상이하다. UB는 ‘서류-필기-면접’, ICT는 ‘코딩테스트-면접’ 전형을 적용하며, 공인회계사는 면접 중심으로 선발한다. 보훈·특성화고·전역장교 등은 사회적 책임 채용으로 별도 절차가 마련된다.
서류 접수는 9월 9일(화) 18시 마감, 최종 합격자는 11월 중 발표된다. 이번 채용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문직 신설·수시채용 확대, ▲사회적 포용 인재 선발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국민은행은 “금융·디지털·전문성을 아우르는 미래형 인재” 확보를 강조하며 다양한 지원을 당부했다.
 “생산적 협상 계속 중”… 한·미 무역협상, ‘불공정 장벽’ 해소에 진전 보일까
2025년 7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국이 설정한 8월 1일 시한 전까지 이른바 ‘불공정 무역장벽’에 대한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는 단순 관세 문제를 넘어 향후 한미 경제 동맹의 기조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생산적 협상 계속 중”… 한·미 무역협상, ‘불공정 장벽’ 해소에 진전 보일까
2025년 7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국이 설정한 8월 1일 시한 전까지 이른바 ‘불공정 무역장벽’에 대한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는 단순 관세 문제를 넘어 향후 한미 경제 동맹의 기조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세계의 술잔, 나이로 갈린 경계선 … 방아쇠는 당겨도, 맥주 캔은 못 따는 미국의 20세 청년
세계의 술잔, 나이로 갈린 경계선 … 방아쇠는 당겨도, 맥주 캔은 못 따는 미국의 20세 청년
 군복 패션으로 레전드 남긴 아이브 장원영.. 군복까지 찰떡!!
군복 패션으로 레전드 남긴 아이브 장원영.. 군복까지 찰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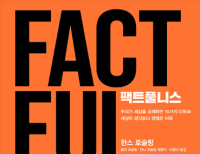 [서평] 팩트풀니스 : 빌 게이츠가 유퀴즈에서 추천한 바로 그 책,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서평] 팩트풀니스 : 빌 게이츠가 유퀴즈에서 추천한 바로 그 책,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커피 값으로 가전? 다이소가 흔든 생활가전 시장
커피 값으로 가전? 다이소가 흔든 생활가전 시장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