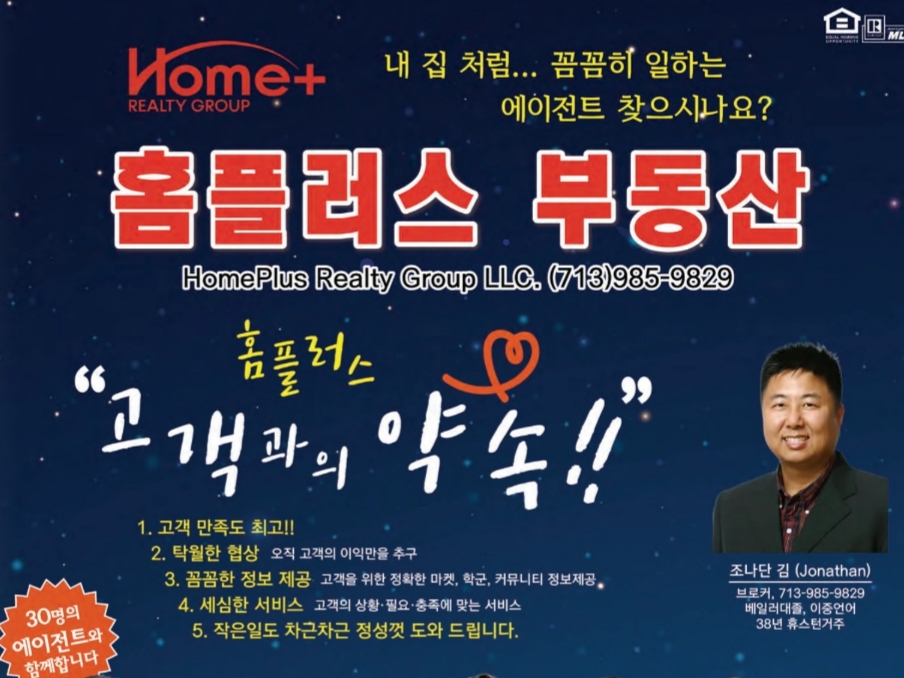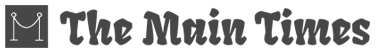- “고함 같은 대화, 공공장소 소음의 주범은 누구?”
- “공공장소 소음, 직장인들의 큰 목소리 논란”
- “식당 소음 민원 15%, 직장인들이 문제라고?”

공공장소 소음, 직장인들의 큰 목소리가 만드는 불편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문제
광화문 근처의 회사에 다니는 J씨는 얼마 전 혼자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옆 테이블의 직장인들이 너무 크게 웃고 떠드는 바람에 굉장히 불편하게 식사를 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온 카페에서 옆자리에 직장인 무리가 앉아서 역시 크게 웃고 떠드는 바람에 커피 마저 불편한 마음으로 마셔야 했다.
식당, 카페,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웃는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의 모임에서 발생하는 큰 웃음소리와 고성은 공공장소의 평온을 깨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소음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심지어 정신적 피로까지 유발할 수 있다.
1. 공공장소 소음의 실태
공공장소에서의 소음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음은 스트레스, 수면 장애, 심혈관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8년 보고서는 50dB 이상의 소음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화 소음(60dB 이상)이 집중력을 저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2024년 소음 민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생활 소음 민원은 약 2만 건으로, 이 중 식당과 카페 관련 민원이 15%를 차지했다.
SNS에서는 직장인들의 소음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는 “강남역 카페에서 조용히 일하려 했는데 옆 테이블 아저씨들 목소리가 너무 커서 헤드셋을 껴도 들린다”고 포스트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식당에서 가족과 밥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고함치듯 웃는 소리에 아이가 놀랐다”고 밝혔다. 이는 소음이 타인의 공간 이용을 방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왜 직장인들의 소음이 문제인가?
직장인들의 큰 소음은 몇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한국의 직장 문화는 회식과 사교 모임에서 활기찬 대화를 장려한다. 한국사회학회의 2023년 논문(“한국의 회식 문화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르면, 회식에서의 큰 목소리는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요소로 인식되지만, 공공장소로 확장되면 문제로 작용한다. 둘째, 소음에 대한 인식도 낮다. 한 SNS 사용자는 “아저씨들이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조용히 해줬으면”라고 지적했다.
3. 시민들의 불만과 반응
SNS에서 살펴본 불만은 주로 식당과 카페에서의 소음에 집중되었다. 주요 불만은 다음과 같다:
큰 목소리와 웃음소리: “식당에서 아저씨들 대화 소리가 TV보다 커요. 도저히 밥을 못 먹겠음”
공간 점유: “카페에서 직장인들이 테이블 여러 개 차지하고 떠들어서 자리도 없고 시끄럽다”
시간대 문제: “저녁 시간대 식당은 직장인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가족 손님이 불편해한다”
일부 사용자는 “그분들도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며 이해를 표했으나, 대다수는 “공공장소에서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4. 국제 사례: 일본의 접근
일본에서는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도쿄의 “침묵 카페”(Silent Cafe)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 금지 구역을 운영하며, 방음 칸막이와 흡음재를 활용한다. 2024년 NHK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카페는 학생과 프리랜서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5. 해결 방안 제안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소음 인식 캠페인: 서울시의 “조용한 서울” 캠페인을 확장해 SNS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강화한다.
공간 설계 개선: 일본의 침묵 카페처럼 방음 설비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조용한 구역”을 운영한다.
시민 참여 제도: 서울시 오아시스 플랫폼을 통해 소음 관련 제안을 적극 수렴한다.
법적 규제 강화: 소음·진동관리법을 공공장소 생활 소음까지 확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식당과 카페에서의 직장인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공공장소의 쾌적함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환경부 통계와 SNS의 시민 목소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일본의 사례는 실질적인 해결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공장소는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인 만큼, 개인의 인식 개선과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 업주, 시민이 함께 소음 없는 공공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뒷산도 안 오르던 대기업 이사님, 히말라야를 정복(?)하다 : 히말라야에서 얻은 깨달음
대기업 이사님이 뒷산도 오르지 않던 초보 등산가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도전, 두 달간 히말라야, 중앙아시아, 스페인, 제주도를 오가며 글로벌 여정을 마무리했다. 9일간의 트레킹에서 고산병 대비와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대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태도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고, 직장인으로서 직원들에게 보름 이상의 리프레시 휴가를 장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페인 미술관과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음악, 미술 등 새로운 취미를 불러일으켰으며, 체중 4~5kg 감소 등 건강 개선 효과도 얻었다. 그는 “여건이 안 되더라도 시간을 만들어 도전하라”며 삶의 풍요로움을 강조했다.
뒷산도 안 오르던 대기업 이사님, 히말라야를 정복(?)하다 : 히말라야에서 얻은 깨달음
대기업 이사님이 뒷산도 오르지 않던 초보 등산가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도전, 두 달간 히말라야, 중앙아시아, 스페인, 제주도를 오가며 글로벌 여정을 마무리했다. 9일간의 트레킹에서 고산병 대비와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대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태도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고, 직장인으로서 직원들에게 보름 이상의 리프레시 휴가를 장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페인 미술관과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음악, 미술 등 새로운 취미를 불러일으켰으며, 체중 4~5kg 감소 등 건강 개선 효과도 얻었다. 그는 “여건이 안 되더라도 시간을 만들어 도전하라”며 삶의 풍요로움을 강조했다.
 지난주 미국 증시 활황, 이번 주 전망은? : S&P 500 6,260포인트, 상승세 어디까지?
지난주(6월 30일~7월 4일) 미국 증시는 S&P 500이 0.30% 하락했으나 한 달간 5.40% 상승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 지표 호조(6월 비농업부문 고용 206,000명 증가, 실업률 4.1%),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78.8%)이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원자재 시장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잠재적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주(7월 7일~11일)는 CPI, PPI 등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발표, 연준 정책회의 결과가 시장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투자 심리 강세(AAII 45%)와 VIX 상승은 단기 변동성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술주와 금융주 중심의 신중한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지난주 미국 증시 활황, 이번 주 전망은? : S&P 500 6,260포인트, 상승세 어디까지?
지난주(6월 30일~7월 4일) 미국 증시는 S&P 500이 0.30% 하락했으나 한 달간 5.40% 상승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 지표 호조(6월 비농업부문 고용 206,000명 증가, 실업률 4.1%),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78.8%)이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원자재 시장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잠재적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주(7월 7일~11일)는 CPI, PPI 등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발표, 연준 정책회의 결과가 시장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투자 심리 강세(AAII 45%)와 VIX 상승은 단기 변동성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술주와 금융주 중심의 신중한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카페를 뒤흔드는 아저씨들의 웃음소리, 이대로 괜찮나?
식당과 카페에서 직장인들의 큰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소음을 유발하며, 타인의 휴식과 집중을 방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WHO에 따르면, 50dB 이상의 소음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환경부 2024년 통계에서는 식당·카페 관련 소음 민원이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X 플랫폼에서는 “카페에서 아저씨들 목소리가 너무 크다”등의 불만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회식 문화와 소음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일본의 “침묵 카페” 사례처럼 방음 설비와 조용한 구역 운영, 시민 캠페인, 법적 규제 강화 등의 해결 방안이 제안되었다. 공공장소의 쾌적함을 위해 개인 배려와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다.
카페를 뒤흔드는 아저씨들의 웃음소리, 이대로 괜찮나?
식당과 카페에서 직장인들의 큰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소음을 유발하며, 타인의 휴식과 집중을 방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WHO에 따르면, 50dB 이상의 소음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환경부 2024년 통계에서는 식당·카페 관련 소음 민원이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X 플랫폼에서는 “카페에서 아저씨들 목소리가 너무 크다”등의 불만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회식 문화와 소음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일본의 “침묵 카페” 사례처럼 방음 설비와 조용한 구역 운영, 시민 캠페인, 법적 규제 강화 등의 해결 방안이 제안되었다. 공공장소의 쾌적함을 위해 개인 배려와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시한 교수, KBS <오늘아침 1라디오>에서, ‘이시한의 읽는사람’으로 청취자와 책 수다 시작
이시한 교수가 KBS 1라디오 <오늘아침 1라디오>의 새 코너 ‘이시한의 읽는사람’ 진행자로 합류하며, 2025년 7월 4일 첫 방송에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주제로 삶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KBS 카리나’로 불리는 정은혜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이시한 교수와 유쾌한 케미를 선보였다. 이 코너는 책을 매개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수다’를 나누는 형식으로, 청취자들이 책 한 권을 읽은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첫 방송에서는 연금술사의 단순한 스토리가 전하는 자아 발견의 메시지와 코엘료의 삶을 소개하며, 독서의 현대적 의미와 완독 비결로 ‘마감’을 강조했다. 청취자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한 코너로, 매주 책과 삶의 통찰을 나누며 아침을 지적으로 채울 전망이다.
이시한 교수, KBS <오늘아침 1라디오>에서, ‘이시한의 읽는사람’으로 청취자와 책 수다 시작
이시한 교수가 KBS 1라디오 <오늘아침 1라디오>의 새 코너 ‘이시한의 읽는사람’ 진행자로 합류하며, 2025년 7월 4일 첫 방송에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주제로 삶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KBS 카리나’로 불리는 정은혜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이시한 교수와 유쾌한 케미를 선보였다. 이 코너는 책을 매개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수다’를 나누는 형식으로, 청취자들이 책 한 권을 읽은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첫 방송에서는 연금술사의 단순한 스토리가 전하는 자아 발견의 메시지와 코엘료의 삶을 소개하며, 독서의 현대적 의미와 완독 비결로 ‘마감’을 강조했다. 청취자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한 코너로, 매주 책과 삶의 통찰을 나누며 아침을 지적으로 채울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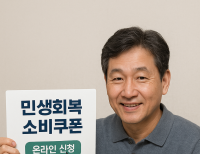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신청하지? ... 사례로 보는 신청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신청하지? ... 사례로 보는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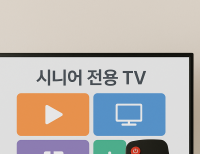 LG전자, 국내 최초 ‘시니어 TV’ 연내 출시
LG전자, 국내 최초 ‘시니어 TV’ 연내 출시
 “10년 후 나를 설계한다” …서울시, 4060대상 ‘인생디자인학교’ 하반기 250명 모집
“10년 후 나를 설계한다” …서울시, 4060대상 ‘인생디자인학교’ 하반기 250명 모집
 [한컷 만화] 꾀병녀
[한컷 만화] 꾀병녀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