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주가 상승, 구조적 불안도 여전
- 에너지 사업이 이끄는 테슬라 반등
- 로보택시 기대가 키운 주가 탄력

테슬라, 반등세 속에 ‘지금 사야 할까’
최근 테슬라 주가가 가파른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10% 이상 상승하며 기술적 돌파 신호를 보여줬지만, 실적 둔화와 전기차 수요 약화, 경쟁사 공세 등 구조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 단순한 추격 매수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반등의 배경: 로보택시와 에너지 사업
테슬라 주가가 다시 힘을 얻은 배경에는 ‘이야기’가 있다. 우선 시장은 로보택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FSD)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규제 퍼밋이 진전되고, 로보택시 앱 공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옵션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축은 에너지 저장 사업이다. 테슬라의 메가팩(Megapack)과 같은 대형 배터리 저장 장치는 전력 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배경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자동차 부문의 변동성을 상쇄할 카드로 에너지 사업을 지목한다. 자동차 기업을 넘어 에너지·AI·로봇 기업으로 진화한다는 스토리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린 셈이다.

기업 펀더멘털은 여전히 시험대
하지만 테슬라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시험대 위에 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했고, 총마진도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 역시 “앞으로 몇 분기는 거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하락세에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미국·유럽 완성차 기업들의 신모델 출시가 이어지면서 테슬라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내 전기차 세금 인센티브 축소, 멕시코 관세 추진 등 정책 변수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투자 포인트: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첫째, 에너지 사업은 자동차 부문을 넘어 테슬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전력망의 전환과 맞물려 고성장을 이어간다면 안정적인 수익 기둥이 될 수 있다.
둘째,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단기간에 성과를 담보하긴 어렵지만, 규제와 기술이 진전되면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지역에서 시험 영업이 본격화된다면 투자자 심리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
셋째, 테슬라가 쌓아온 브랜드 파워와 충전 인프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역량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로봇 ‘옵티머스’와 같은 신사업도 투자자에게 옵션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리스크: 어디에 주의해야 하나
그러나 리스크 요인도 만만치 않다. 첫째, 실적 미스가 반복될 경우 주가 반등은 쉽게 꺾일 수 있다. 가격 인하 경쟁이 격화되고, 수요 둔화가 장기화되면 총마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규제 리스크다.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과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로보택시 허가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 규제 한 방에 ‘미래 스토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셋째, 정책 변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북미·멕시코·EU의 관세나 보조금 정책 변화가 판도를 뒤흔들 수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겹치면 전기차 소비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전략: 추격 매수보다 분할 접근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 전문가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소액으로 접근하고, 주가가 눌릴 때마다 일정 비율씩 추가 매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조언이다.
비중 역시 전체 투자자산의 5~10% 선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슬라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과 익절 규칙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적 발표나 규제 뉴스가 있을 때마다 포지션을 재점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전략이다.
최종 분석: 기회와 리스크의 공존
테슬라는 지금도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스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은 안정적 성장을,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은 미래의 옵션 가치를, 브랜드와 생태계는 장기적 진입장벽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적 둔화, EV 수요 약화, 경쟁 격화, 규제와 정책 변수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올인’할 대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장기 분산 투자 전략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금의 반등세는 분명 긍정적 신호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적인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결국 승부는 에너지와 자율주행 사업의 현실화, 그리고 실적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
 거북섬은 왜 그럴까?... ‘대한민국의 두바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은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개발돼 세계 최대급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연간 200만 명 방문을 꿈꿨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상가 공실률은 87%에 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미분양률이 40~50% 수준에 머문다. 과도한 수요 예측, 부족한 교통·생활 인프라, 정치적 치적 논란, 경기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개선, 유휴 공간 전환, 투명한 사업 구조를 통해 거북섬이 재도약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거북섬은 왜 그럴까?... ‘대한민국의 두바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은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개발돼 세계 최대급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연간 200만 명 방문을 꿈꿨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상가 공실률은 87%에 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미분양률이 40~50% 수준에 머문다. 과도한 수요 예측, 부족한 교통·생활 인프라, 정치적 치적 논란, 경기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개선, 유휴 공간 전환, 투명한 사업 구조를 통해 거북섬이 재도약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뇌 건강, ‘8시간 수면’보다 중요한 '이것' 드러났다
오랫동안 “하루 8시간 수면”이 건강의 기준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과 규칙성이 뇌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틱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며, 이는 치매와 직결된다. 교대근무자처럼 불규칙한 생활은 치매·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 단순한 수면 시간이 아니라 깊고 규칙적인 잠이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
뇌 건강, ‘8시간 수면’보다 중요한 '이것' 드러났다
오랫동안 “하루 8시간 수면”이 건강의 기준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과 규칙성이 뇌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틱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며, 이는 치매와 직결된다. 교대근무자처럼 불규칙한 생활은 치매·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 단순한 수면 시간이 아니라 깊고 규칙적인 잠이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
 한국기업인줄 알았지만 의외로 외국기업인 기업들.. 쿠팡, 배민에 카스, 잡코리아까지!!
겉으로는 한국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국 기업 소속인 사례가 늘고 있다. 쿠팡은 미국 법인, 배달의민족은 독일 자본, 카스는 벨기에 본사 소속이다. 금호타이어·아가방·잡코리아는 중국·홍콩·호주 자본이 지배하며, 린나이는 일본,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인이 운영한다. 유한킴벌리는 한·미 합작으로 다수 지분을 미국 본사가 가진다. 한국에서 소비·고용 기여도가 크더라도 이익 귀속과 경영권은 외국 본사에 있다. 이처럼 ‘한국의 얼굴을 한 외국 기업’ 현상은 글로벌 자본 이동 속 기업 정체성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한국기업인줄 알았지만 의외로 외국기업인 기업들.. 쿠팡, 배민에 카스, 잡코리아까지!!
겉으로는 한국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국 기업 소속인 사례가 늘고 있다. 쿠팡은 미국 법인, 배달의민족은 독일 자본, 카스는 벨기에 본사 소속이다. 금호타이어·아가방·잡코리아는 중국·홍콩·호주 자본이 지배하며, 린나이는 일본,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인이 운영한다. 유한킴벌리는 한·미 합작으로 다수 지분을 미국 본사가 가진다. 한국에서 소비·고용 기여도가 크더라도 이익 귀속과 경영권은 외국 본사에 있다. 이처럼 ‘한국의 얼굴을 한 외국 기업’ 현상은 글로벌 자본 이동 속 기업 정체성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생산적 협상 계속 중”… 한·미 무역협상, ‘불공정 장벽’ 해소에 진전 보일까
2025년 7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국이 설정한 8월 1일 시한 전까지 이른바 ‘불공정 무역장벽’에 대한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는 단순 관세 문제를 넘어 향후 한미 경제 동맹의 기조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생산적 협상 계속 중”… 한·미 무역협상, ‘불공정 장벽’ 해소에 진전 보일까
2025년 7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국이 설정한 8월 1일 시한 전까지 이른바 ‘불공정 무역장벽’에 대한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는 단순 관세 문제를 넘어 향후 한미 경제 동맹의 기조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최근 10% 반등한 테슬라 주식, 지금 사도 될까?
최근 10% 반등한 테슬라 주식, 지금 사도 될까?
 박진영은 공직, 방시혁은 수사…K-POP 두 거장의 엇갈린 운명
박진영은 공직, 방시혁은 수사…K-POP 두 거장의 엇갈린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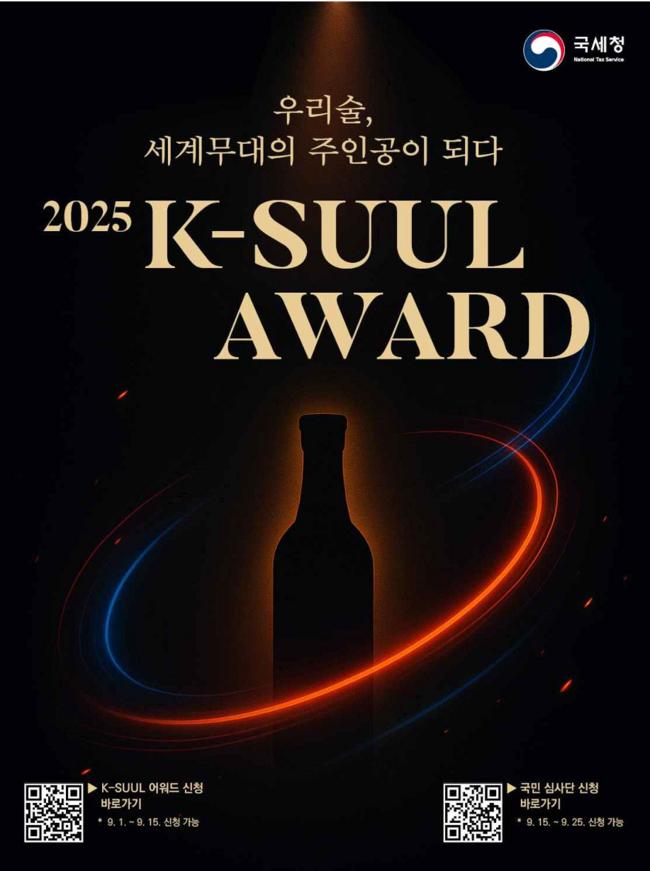 국민이 뽑은 우리 술, 세계 무대에 선다
국민이 뽑은 우리 술, 세계 무대에 선다
 개인정보위, KT·LGU+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 KT·LGU+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