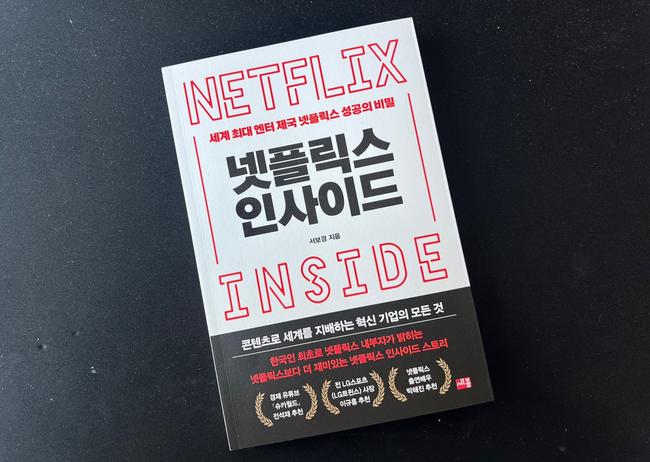- 지원도 안 했는데 스카웃? 넷플릭스의 채용 방식
- “그건 너무 적은 것 같아” — 연봉 협상의 반전
- 프로팀처럼 일하는 사람들, 가족보다 냉정한 신뢰

“연봉 협상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다음 날 보스가 와서 ‘그건 너무 적은 것 같아. 네가 말한 것보다 더 줄게’라고 하더군요.”
서보경 작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다. 숫자를 깎지 않고, 오히려 올려주는
회사라니. “진짜인가요?” 하고 되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그게 회사의 문화이자 방침이에요.”
그가 몸담았던 회사는 넷플릭스였다. 세계 최대의 스트리밍 제국을 만들어낸 조직. 하지만 그 내부를 직접 경험한 한국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는 그동안 많지 않았다. 그는 신간 『넷플릭스 인사이드』에서 그 경험을 담담히, 그러나 뜨겁게 풀어낸다.
“지원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2019년 어느 날, 서보경 작가는 외국에서 인도 억양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넷플릭스 인사팀인데, 함께 일할 생각이 있나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공식 이메일이 오고, 채용 서류가 오가고 나서야 믿게 됐다.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찾는다.” 그게 넷플릭스식 스카웃이었다.
“헤드헌터를 통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연봉과 조건은 우리가 최고 수준으로 맞춰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연락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오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연봉 협상 때도 그 문화는 그대로 드러났다. 그가 조심스레 제시한 금액보다, 오히려 두 배 이상 높은 제안을 받았다.
“너무 놀라서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했잖아. 너 이거 때문에 섭섭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웃더군요.”
“그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관대함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었다. ‘프로로서의 책임’.
“첫 출근날부터 느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많이 주는지.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맡은 역할의 끝까지 책임을 지는 조직이었어요.”
그는 그 문화를 ‘프로팀’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프로야구 팀이에요. 실력이 없다면 바로 교체될 수 있지만, 그 대신 최고의 대우를 받죠. 내부에서는 스스로를 ‘4대 보험 받는 프리랜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회사는 정이 아닌 성과로 움직였고, 회의조차도 철저히 효율로 운영됐다.
“회의 시간은 30분이 원칙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들어오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요. 의미 없는 회의는 바로 취소됩니다. 인터뷰도 30분씩 6번이나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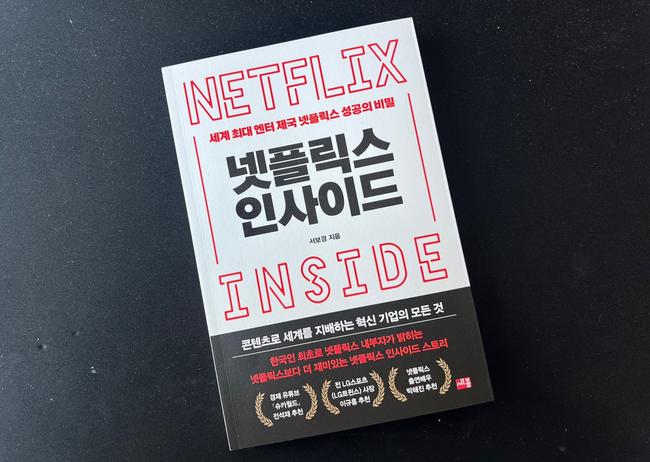
“휴가를 자유롭게 써라, 대신 결과로 증명해라”
넷플릭스에는 ‘규칙 없음(No Rules Rules)’이라는 사내 철학이 있다. 휴가 제한도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그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1년에 30~40일씩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휴양지에서도 노트북을 열어요. 결과를 내면 그게 전부예요. 저요?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 자유는 곧 책임이었다.
“결국 넷플릭스는 당신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그 신뢰에 맞는 결과’를 요구하는 조직이에요.”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
넷플릭스에서 그가 얻은 가장 큰 보상은 돈이 아니었다.
“진짜 복지는 동료였어요. 업계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커쇼 옆에서 던지는 법을 배우는 투수처럼, 매일 성장하는 느낌이었죠.”
그는 함께 일하던 마케터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여성 마케터가 라는 군대 드라마를 맡았는데, 군대에 관심도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군대물이 아니라 미스터리 수사극으로 팔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대박이 났죠. 아이디어와 분석력,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한 천재였어요.”
“넷플릭스는 나를 성장시킨 학교였어요”
그는 결국 넷플릭스를 떠났지만, 그 경험은 인생의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그 안에서는 늘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하루하루가 마라톤인데 100미터 달리기처럼 느껴졌죠.”
연봉보다 무거운 건 책임이었고, 그 책임을 견디게 한 건 배움의 즐거움이었다.
“결국 넷플릭스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 학교였어요. 나는 그곳에서 ‘일을 잘한다는 게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더 줄게요.’
그 문장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다.
실력을 믿고, 결과로 말하라는 조직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서보경 작가의 말처럼, 넷플릭스가 만든 건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
일과 사람, 그리고 자유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었다.
- 관련기사
-
- TAG
-
 Seoul Eco Hiking Festa
The Seoul Tourism Organization (CEO Gil Ki-yeon) announced that it will host the Seoul Eco Hiking Festa at Namsangol Hanok Village over two weekends—November 15 (Sat)–16 (Sun) and November 22 (Sat)–23 (Sun)—to celebrate the beauty of autumn in the city.This event offers a variety of themed hiking programs, including a “Performance Hiking” and a “Family Hiking", allowing both Seoul citizens and internation...
Seoul Eco Hiking Festa
The Seoul Tourism Organization (CEO Gil Ki-yeon) announced that it will host the Seoul Eco Hiking Festa at Namsangol Hanok Village over two weekends—November 15 (Sat)–16 (Sun) and November 22 (Sat)–23 (Sun)—to celebrate the beauty of autumn in the city.This event offers a variety of themed hiking programs, including a “Performance Hiking” and a “Family Hiking", allowing both Seoul citizens and internation...
 From K-pop to K-Seafood : Korea’s Seafood Industry Sets Sail for Global Markets
Busan is emerging as the epicenter of the K-Seafood bo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er Jeon Jae-soo) announced that a large-scale trade consultation and international buyers’ meeting will be held at BEXCO’s Exhibition Hall 1 from November 5 to 7 during the Busan International Seafood & Fisheries Expo (BISFE). ■ Buyers from 19 Countries Show Strong Interest in K-SeafoodThe event will bring together 80 buyers from...
From K-pop to K-Seafood : Korea’s Seafood Industry Sets Sail for Global Markets
Busan is emerging as the epicenter of the K-Seafood bo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er Jeon Jae-soo) announced that a large-scale trade consultation and international buyers’ meeting will be held at BEXCO’s Exhibition Hall 1 from November 5 to 7 during the Busan International Seafood & Fisheries Expo (BISFE). ■ Buyers from 19 Countries Show Strong Interest in K-SeafoodThe event will bring together 80 buyers from...
 [메인타임스×시한책방 북터뷰] 넷플릭스 인사이드 (서보경 작가) : “그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더 줄게요”... 넷플릭스식 연봉 문화의 진짜 의미
넷플릭스 출신 서보경 작가는 신간 『넷플릭스 인사이드』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독특한 문화를 생생히 전한다. 지원하지 않아도 스카웃되는 채용 방식, “그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더 줄게요”라던 연봉 협상, 30분 회의와 ‘규칙 없음’의 자율 문화—이 모든 건 프로로서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는 “넷플릭스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 학교였다”며, 최고의 복지는 연봉이 아니라 동료였다고 회상한다.
[메인타임스×시한책방 북터뷰] 넷플릭스 인사이드 (서보경 작가) : “그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더 줄게요”... 넷플릭스식 연봉 문화의 진짜 의미
넷플릭스 출신 서보경 작가는 신간 『넷플릭스 인사이드』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독특한 문화를 생생히 전한다. 지원하지 않아도 스카웃되는 채용 방식, “그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더 줄게요”라던 연봉 협상, 30분 회의와 ‘규칙 없음’의 자율 문화—이 모든 건 프로로서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는 “넷플릭스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 학교였다”며, 최고의 복지는 연봉이 아니라 동료였다고 회상한다.

 UAE 왕세자, 비밀 재료 넣은 한국 볶음김치에 반해서 벌인 일
UAE 왕세자, 비밀 재료 넣은 한국 볶음김치에 반해서 벌인 일
 정소민은 왜 만날 똑같은 역할 같은데, 왜 만날 로코 퀸의 자리에 오를까?
정소민은 왜 만날 똑같은 역할 같은데, 왜 만날 로코 퀸의 자리에 오를까?
 국뽕이 차오른다!!!.. 젠슨 황의 선물, 엔비디아 한국 헌정 영상 공개..
국뽕이 차오른다!!!.. 젠슨 황의 선물, 엔비디아 한국 헌정 영상 공개..
 정년 65세 시대, 2033년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일자리·세대 갈등 논의 본격화
정년 65세 시대, 2033년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일자리·세대 갈등 논의 본격화
 윤석열 발언, '여사' 호칭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그만두고 나왔다'는 왜곡된 인식
윤석열 발언, '여사' 호칭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그만두고 나왔다'는 왜곡된 인식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