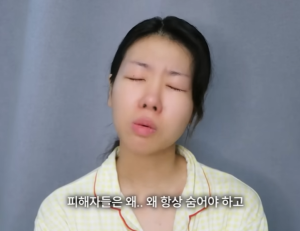9월 6일, 강릉은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3% 안팎으로 떨어지며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같은 시각 남부지방은 시간당 50~70mm 폭우가 쏟아져 도로와 마을이 잠기고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 한반도 안에서 ‘가뭄 vs. 폭우’가 동시에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 상황과 원인을 짚고, 기후변화와의 연결고리까지 분석했다.
9월 6일 오전 9시, 강릉시는 공동주택 113곳과 호텔 10곳 등 대형 수용가 123곳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9%까지 떨어졌고, 시민들에게는 1인당 12리터 생수가 배부됐다. 군 헬기와 해경 함정, 급수차가 총동원돼 하루 2만 톤 이상을 끌어왔지만 저수율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평창 도암댐의 ‘비상 방류’까지 검토하고 있다. 도수관로 수질 재점검이 20년 만에 진행됐고, 관로 정비 시 하루 1만 톤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수질 안정성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은 유보된 상태다.
같은 시각 남부지방은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들었다. 8월 3일 전남 무안에는 시간당 142.1mm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무안국제공항 누수와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했다. 누적 강수량은 무안 257.5mm, 광주 195.9mm, 담양 196.0mm를 기록했다. 경남 합천은 201.1mm가 내리며 1,600여 가구가 대피했고, 산청·함양 등지에서는 산사태와 정전 피해가 속출했다. 9월 2일에는 창원에서도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로 도심 침수와 맨홀 역류 신고가 이어졌다.
9월 6일 기상청 예보에서도 “호남 중심 시간당 50mm 안팎 강우”가 제시되는 한편, 강원 동해안은 “약한 비”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지역별 대조가 더욱 뚜렷했다.

① 단기 기상 배치: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남서풍을 타고 호남·영남 서부에 집중된 반면, 영동은 구름이 동진하지 못해 소강 상태가 이어졌다.
② 태백산맥 효과: 서풍이 우세할 때 영동은 하풍 지역으로 건조·고온 현상이 심해져 푄(föhn) 효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 같은 저기압 환경에서도 ‘강수 음영’이 생겨 비가 비껴간다.
③ 수자원 구조 취약성: 강릉은 생활용수의 87%를 오직 오봉저수지에 의존한다. 단일 상수원 의존도가 높을수록 강수 부족이 곧바로 급수 불안으로 이어진다.
④ 마른 장마 + 폭염: 올해 장마철 강릉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약 380mm)으로 줄었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크게 높았다. 비는 적고 증발산은 커진 전형적인 ‘돌발가뭄’ 조건이었다.
기후변화는 이런 ‘물 양극화’를 가속화한다.
IPCC 6차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1℃ 상승할 때 극한 강수량이 약 7% 증가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는 특히 강한 신호가 관측·예측 모두에서 확인된다.
반대로, Nature (2025) 연구는 지난 40년간 대기 증발수요(AED) 증가가 전 세계 가뭄 심각도를 평균 40% 높였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 동안 가뭄 면적은 74% 확대됐고, 그중 58%는 AED 증가 때문이었다. 즉 더워진 공기가 토양·식생·저수지의 수분을 더 빨리 빼앗아 ‘돌발가뭄’을 악화시키고 있다.
강릉: 평년 이하 강수 + 폭염 → 단일 상수원 고갈 → 제한급수·생수 배부.
남부: 정체전선과 저기압 → 시간당 100mm 안팎 폭우 → 침수·산사태·대피.
결국 기후변화는 “더 센 비와 더 빠른 가뭄”을 동시에 밀어 올리고 있다. 어제 한국을 갈라놓은 풍경—동쪽은 말라가고 남쪽은 잠기는—은 예외가 아니라 점차 평균이 되어가는 중이다. 앞으로는 가뭄과 홍수를 별개로 다루지 않고, 같은 해·같은 권역 안에서 동시 대응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